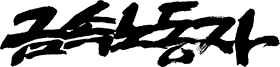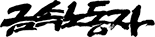영화 <지슬 : 끝나지 않은 세월2>(아래 <지슬>) 보기는 단지 영화를 관람하는 행위가 아니다. 제주 4.3의 죽은 원혼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형식으로 구성한 영화 <지슬>을 보기 위해선 제사에 동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계엄 군경과 서북청년단이 제주에서 초토화 작전을 시작한 직후인 1948년 11월, ‘큰 넓궤’라 불린 동굴과 정방폭포 등지에서 죽은 영혼들을 만나야 한다.
신위(神位 : 영혼을 모셔 앉히다) - 지역영화로서 <지슬>
<지슬>은 한국영화이지만 한글자막이 있는 영화다. 제주도 말을 담은 영화이기 때문이다. 영화를 만든 스텝, 배우들은 제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다. 자막을 읽지 않으면 <지슬>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 영화 <지슬>을 한국영화라고 부를 수 있을까? 제주영화, 혹은 지역영화라고 불러야 할까?
영화 <지슬>을 거쳐 1948년의 제주 사람들을 만나 그 영혼을 2018년 지금, 이곳에 모셔 앉히기 위해선 먼저 제주도 말의 지역성에 관해 얘기해야 한다. 한국의 근대화 과정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도시화 과정이었다.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없애거나 표준화하는 과정이었다. 한국 근대화과정에서 지역이란 없다.

영화 <친구>에서 부산 사투리를 걸쭉하게 사용한 이후 많은 영화가 지역 특수성을 살리고 있지 않으냐고 반문할 수 있다. <친구>는 도구로써 배경과 사투리만 살렸을 뿐이다. 지역사회의 고유한 문화와 사회구조를 토대로 만든 영화는 아니었다. 1948년의 제주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선, ‘제주’라는 공간의 지역적 특수성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 <지슬>은 어쩌면 한국에서 유일하게 지역영화라고 부를 수 있는 영화다.
신묘(神墓 : 영혼이 머무는 곳) - 공동체영화로서 <지슬>
“바다에서 5Km 밖에 있으면 다 죽인다고?” “그럼 바다 쪽으로 내려오라는 건가?” “바다 쪽은 완전 난리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제주 사람들은 초토화 작전이 시작된 이후 아랫마을 사람들이 학살됐다는 소문을 듣고, 살기 위해 산으로 올라간다. 무동의 어머니는 다리가 성치 않아 아이들만 데리고 떠나라며 지슬(감자의 제주도말)을 싸서 주지만 무동은 어머니가 걱정돼 지슬은 놔두고 아이들만 데리고 떠난다. 원식이 삼촌은 급하게 떠나느라 집에서 키우는 돼지에게 먹이를 주지 못하고 산으로 간다. 이들은 며칠만 동굴에 있으면 될 거로 생각하고 ‘큰 넓궤’라 불리는 동굴로 피신한다.
좁고 어두운 동굴 안에 모인 사람들, 밤이 찾아와 추위에 떨며 나누는 대화. “근데, 무동아, 네 어머니는 어쩌고 너희만 왔어?” “아이고 말도 마세요. 우리 어머니 고집은.” “그나저나 우리 돼지 밥 줘야 하는데 큰일이네.” “형님, 거 돼지가 수컷이요, 암컷이요?” “수컷인데 왜?” “그럼 우리 암퇘지랑 접이나 한번 붙이죠.” “접붙여주면 뭐 줄 건데?” “뒷다리라도 하나 드릴까? 새끼 하나 드릴게요.” 죽음 앞에서 소풍이라도 온 듯 왁자지껄 일상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당시 제주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선 제주의 공동체 문화를 알아야 한다. 제주는 육지와 달리 이념대립보다 토착 공동체 문화가 강했고, 해방공간의 서로 다른 이념은 공존했다.
음복(飮福 : 영혼이 남긴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 - 제의영화로서 <지슬>
동굴에 숨어있던 사람들은 하나둘 마을로 내려온다. 원식이 삼촌은 돼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만철이는 자신이 짝사랑하는 순덕이가 동굴로 오지 못하고 마을에 남아 있어서 찾아 데려오기 위해, 무동이는 어머니가 잘 있는지 살펴보고 동굴 사람들에게 줄 지슬을 구해오기 위해.
원식이 삼촌은 군인들의 먹이가 된 돼지를 발견한 이후 사살당하고, 만철이는 순덕이가 군인에게 강간당한 뒤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하며, 무동이는 불에 탄 집과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한다. 어머니의 품에 남기고 간 지슬 한 봉지가 그대로 남아있다. 무동이는 눈물을 감추고 지슬을 동굴로 갖고 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마을 사람들은 무동 어머니의 죽음을 모른 채 지슬이 너무 달다며 맛있게 먹는다.
영화 <지슬>은 씻김굿 같은 영화다. 이 씻김굿은 죽음이 아니라 삶에 관한 굿이다. 이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보여주는 영화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말하는 영화다. 달디 달은 지슬처럼.
소지(燒紙 : 종이를 태우며 드리는 염원) - 세계영화로서 지슬
큰 넓궤 동굴이 군인들에게 발각되고, 마을 사람들은 학살당한다. 제주의 낮게 드리운 안개, 군인들이 놓은 불로 마을 전체가 타오르는 연기, 군인을 쫓기 위해 동굴에서 마을 주민들이 피운 고추 연기 속에서, 죽은 어미의 품 안에 혼자 살아남은 갓난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죽은 영혼을 위한 염원을 쓴 종이가 불에 타 사라져 하늘로 오른다.
영화 <지슬> 보기는 1948년 제주를 기억하기 위함만은 아니다. 2018년 대한민국을 살기 위해 봐야 할 영화다. 2000년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4.3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명예회복도,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과서에 제대로 서술하지 않아 많은 사람이 4.3을 잘 모른다. 4.3 복원은 역사 복원 너머 대한민국의 왜곡된 근대화 과정 전체에 관해 질문하고, 현재를 다시 쓰는 과정이어야 한다. <지슬>은 이를 위한 제의이고, 다시 봐야 할 이유다.
지역의 문화가 세계의 문화이다. 지역을 지워버린 근대화, 세계화란 있을 수 없다. 제주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작업은 제주 시민 역사 복원을 넘어 세계 시민이 동시대를 사는 작업이며, 대한민국이란 민족주의를 넘어 세계공화국으로 가는 출발점이다.
강준상 _ 다큐멘터리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