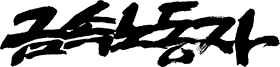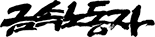4월22일은 제45회 지구의 날, Earth Day 이다.
환경단체에게 지구의 날은 유엔 같은 정부기구가 만든 다른 환경 기념일보다 의미 있는 날이다.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양기름 유출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22일 만들어졌다.
‘지구의 날’이라는 표현만큼 환경문제는 동식물의 어느 한 종이나 지역과 나라 등 한 지역 차원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의 문제이다. 좁은 의미의 환경이라는 개념을 벗어나 확장한 개념, 지구별에 사는 구성원으로서 인간에 대해 생각해보는 날이기도 하다.
90년대 초반부터 지구의 날이 다가오면 환경단체는 차도를 막아 지구의 날 기념행사를 벌이곤 했다. 갖가지 환경이슈를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부스를 차리고 다양한 기념공연을 하고 아이들이 한바탕 뛰어놀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금은 주말마다 광화문 거리가 차 없는 거리로 변하곤 하지만, 90년대엔 딱 그날 하루 지구의 날에만 뻥 뚫린 광화문 거리를 누릴 수 있었다. 차가 없는 도로에서 차가 내뿜는 매연과 경적소리에서 벗어나 도시가 이럴 수 있구나 생각하곤 했었다.
당시 환경단체의 구호 중 가장 흔한 것이 ‘숨 쉬고 싶다’였다. 우리는 이십여 년이 지나며 더 이상 그런 구호를 외치지 않았다. 공해문제라고 했던 대기오염, 수질오염은 이제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운동단체에서 구호로 외치지 않아도 너무 당연히 공공기관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됐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올해 지구의 날을 맞아 환경단체가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다시 ‘우리는 숨 쉬고 싶다’는 슬로건이 등장했다. 초미세먼지 때문이다.
초미세먼지는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에서 30분의 1에 불과한 작은 먼지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먼지는 폐와 모세혈관을 타고 몸 깊숙이 들어가 질병을 일으킨다.
지난해 2월24일 대한민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75시간 동안 지속됐다. 암울한 SF영화가 현실에 나타난 것만 같은, 세기말적 분위기 속에 며칠이 흘렀다. 올해도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알리는 휴드폰 메시지가 거의 날마다 도착했다.
대한민국 주요 도시의 초미세먼지(PM2.5) 오염도는 대기환경기준(25㎍/㎥)을 초과하고 있다. 서울의 올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35㎍/㎥다. 날마다 기준치 이상의 초미세먼지 속에 살아가고 있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는 초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초미세먼지는 호흡기 뿐만 아니라 피부로도 침투해 암을 유발한다고 한다.
‘이게 다 중국 탓, 황사 탓’이라고 말해보지만, 중국 황사로 인한 초미세먼지 피해는 30~50%에 지나지 않는다. 53기에 달하는 석탄 화력발전소,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증가하는 경유차가 대표적인 국내 초미세먼지의 원인이다
특히 국립환경과학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미세먼지의 60.8퍼센트와 경기도의 미세먼지 43.1퍼센트가 자동차에서 발생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경유택시를 도입하고 석탄 화력발전 시설을 앞으로 23기가 더 추가할 예정이다.
규제보다 규제완화가 경제를 살린다는 정부의 철학 아래 우리의 해묵은 구호가 다시 등장한 슬픈 지구의 날을 보내고 있다.
정명희 / <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