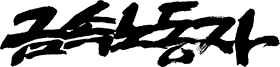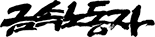여름철 인기를 끄는 공포 혹은 스릴러 영화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나 혹은 내가 기억하는 누군가의 존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존재를 증명하려 할수록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하는 이야기. 그런데 올해는 극장가가 아닌 현실에 존재를 삭제당한 사람들의 얘기가 등장했다. 사주의 배임을 고발하고 그에 따른 부당 인사를 거부한 <한국일보> 기자들이 회사로부터 ‘삭제’당한 것이다.
6월15일 용역을 대동하고 편집국을 찾은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은 당직 기자와 경제부장을 밖으로 내몬 뒤 출입문을 모두 봉쇄했다. 그리고 ‘근로제공 확약서’에 서명을 한 기자들만 편집국에 들여보내 주겠다고 했다. 앞서 사측은 ‘사규를 준수하고 회사에서 임명한 편집국장과 부서장의 지휘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것을 확약한다’고 적힌 문서를 전자우편으로 보냈다.
사측은 신문제작을 위한 전산 시스템도 폐쇄했다. 기자들이 기존 아이디로 접속을 시도하면 “퇴사한 사람입니다.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다. 취재를 하고 기사를 작성해 신문을 만드는 게 일이고 정체성인 기자들이 사주를 반대했다는 이유 하나로 하루아침에 존재를 삭제 당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4월29일 노조가 장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시작됐다. 노조와 다수 사원들은 지난 2002년부터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장 회장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경영난을 이유로 서울 중학동 사옥을 매각할 당시 그 터에 들어설 건물 일부를 140억원에 우선 매수한다고 건설사와 계약했으나, 장 회장이 건설사에서 빌린 증자 대금 200억원을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우선 매수권과 맞바꿨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장 회장 측은 지난 5월1일 이영성 편집국장을 경질하는 인사발령을 했으나, 노조와 기자들은 해임 동의 투표도 없이 장 회장이 자신의 비리를 덮으려 무리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사측에서 정한 새 편집국장을 임명 동의 투표를 통해 거부한 것이다. 하지만 사측은 6월16일 같은 인물을 편집국장 직무대행에 임명했고, 인사를 거부한 채 기자들과 함께 지면을 만들어온 이영성 국장에 대해 해임을 통보했다.
사측과의 다툼 속에서도 ‘정상으로’ 신문을 만들어왔던 170여명의 기자들을 삭제한 후 <한국일보>는 계열사인 <서울경제>와 통신사 콘텐츠를 각각 바이라인(기사 작성자 이름) 없이 베끼거나 짜깁기해 ‘비정상으로’ 제작하고 있다. <서울경제>의 한 기자는 “기사를 쓴 이도 모르는 상황에서 바이라인이 빠진 채 <한국일보>에 누군가가 ‘베낀’ 거의 같은 기사가 게재되고 있다”며 “아침에 <한국일보>를 받아 들 때마다 상식이 실종된 사회에 살고 있는 공포를 느낀다”고 말했다. 논설위원들도 사설 게재를 거부하며 “<한국일보> 경영진이 기자들을 몰아내고 만든 신문은 어떤 기준으로도 도저히 신문으로 부를 수 없는 쓰레기 종이뭉치”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사측은 “‘편집국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하지만 적법한 조처”라고 주장한다. 일부 편집국 간부와 노조 집행부가 편집국을 점거한 채 신임 편집국장 등의 출입과 운영을 방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직접 사안을 취재해 기사를 작성할 기자들을 삭제한 채 신문을 바이라인 없는 기사들과 통신사 콘텐츠를 짜깁기 해 메우는 게 ‘정상화’라니, 언론의 공적 가치는 깡그리 무시한 채 자신의 소유물로만 여기는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잘 만들어진 공포영화들은 그 사회의 불안을 기저에 깔고 있다. 일례로 <엑소시스트>(1973년)만 해도 월남전, 이혼율 급등 등으로 가족이 붕괴된 1970년대 미국 사회에서 아버지의 부재와 그로 인해 겪게 되는 자녀들의 정신적 상처를 공포로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언론을 특정인의 소유물로 여기는 듯한 인식 역시 작금의 <한국일보> 사태에서 처음으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다. 지난 정부를 거치며 MBC, YTN, <부산일보>, <국민일보> 등 수많은 언론사에서 정권과 대주주 등 특정 집단과의 이해를 위해 언론 자유를 말하는 언론인들을 해고·징계했다.
언론의 공적 기능에 대한 사회의 존중과 합의가 수년에 걸쳐 하나 둘 무너짐에 따라, 급기야 파업도 않은 채 정상으로 일하고 있던 기자들이 하루아침에 삭제되고 편집국이 사실상 폐쇄되며 언론사 주변에서 용역 직원들이 감시의 눈길을 번뜩이는 현실까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 흐름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한국일보> 납량특집은 어디서도 또 등장할 수밖에 없다.
김세옥 / <PD저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