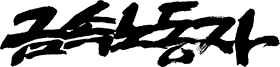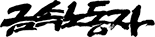최근 하나의 라인에서 여러 차종을 생산하는 자동차 ‘혼류생산’이 확대되고 있다. 혼류생산 확대는 회사와 노조의 이해와 맞물려 있다. 혼류생산은 생산의 유연화를 추구하는 회사와 고용안정을 위한 물량유지를 바라는 노조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노동강도를 높인다는 비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가 혼류생산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8일 금속노조 현장전문위원회가 ‘혼류생산이 작업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현장전문위는 완성차 3사 공장을 방문해 각사의 혼류생산 실태와 작업장 체제, 외주화와 모듈화 현황, 혼류생산과 노동강도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현대차의 경우 울산2공장에서 산타페와 베라크루즈루를, 4공장에서 스타렉스와 제네시스 쿠페를, 5공장에서 제네시스와 에쿠스를, 아산공장에서 소나타와 그랜저를 혼류생산하고 있다. 기아차 화성1공장에서는 소렌토와 모하비·포르테, 화성3공장에서 K5와 K7, 광주1공장에서 쏘울과 카렌스, 광주2공장에서 스포티지R과 쏘울을 각각 하나의 라인에서 만든다. GM대우차는 부평2공장에서 윈스톰과 토스카·알페온을, 창원공장에서 마티즈와 다마스·라보를 생산하고 있다.
현장전문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완성차 3사 노조 모두 혼류생산을 해야 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로 ‘물량 문제’를 꼽았다. 같은 조사에서 회사쪽 관계자들이 혼류생산 도입에 적극적인 데 반해, 노조 간부들의 경우 "물량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대답이 주를 이뤘다.
우리나라 완성차업체들의 혼류생산은 공장별 생산물량 편차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응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는 일본 도요타자동차 등이 ‘다품종 소량생산’이라는 새로운 생산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혼류생산을 시도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 문제는 국내 업체들의 혼류생산 방식이 노동자 내부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물량이 많아 이관하는 쪽과 물량이 부족해 받는 쪽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노조 내 지부-지회 또는 대의원-현장조직 간 갈등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 회사는 생산계획과 라인운영에 관한 주도적 위치를 점하게 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조와 회사 간 힘의 균형은 깨지게 된다. 결국 물량 부족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불안심리가 혼류생산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혼류생산 확대에는 기술적 요인도 한몫했다. 2000년대 들어 플랫폼 통합을 포함한 설계능력의 신장, 다양한 차종을 생산하기 위한 라인 합리화 작업, 부품 조달·공급 방식의 변화가 이어졌다. 모듈화와 외주화도 혼류생산 확대를 부추겼다. 이제는 완성차 3사 모두 주된 차종과 혼류 차종을 가리지 않고 외주화하는 추세다. 아예 신차종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외주화를 염두에 둔 차종까지 나오고 있다.
현장조사에 참여한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노동계는 혼류생산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혼류생산의 부정적인 측면을 제거하면서 생산현장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제휴 / 매일노동뉴스(구은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