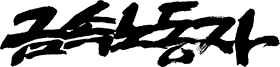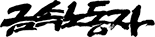지금은 아이들이 자라서 덜하지만, 둘 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 우리 부부도 육아는 전쟁이었다. 결혼한 지 3개월, 3년이 고비라고, 그 고비만 넘기면 괜찮아진다고 누가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떠들었나.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15년이 된 지금도 싸운다. 그것도 치열하게. 하루하루가 고비고 하루하루가 위기다.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아이들이 좀 어릴 때는 부부싸움의 99%는 “누가 아이를 돌볼 것이냐”의 문제로 일어난 일이었다면 지금은 레퍼토리가 좀 다양해진 정도? 당시 “육아는 엄마 몫이다”를 주장하기 위해 남편이 즐겨 ‘인용’하던 이야기 한 자락 들어보시라.
어느 동물학자가 모성애와 부성애 중 어느 편이 강한지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새끼 원숭이와 어미 원숭이를 골방에 가두고 불을 때서 방을 뜨겁게 달구는데, 어미 원숭이는 자기 새끼 데일까 봐 새끼 원숭이를 목말을 태우고 방을 빙빙 돌면서 끝까지 버티니, 새끼 원숭이는 살고 밑에 있는 어미 원숭이가 먼저 타죽더라고 한다. 이번에는 아버지 원숭이와 새끼 원숭이를 방에 넣고 방을 뜨겁게 달구니, 아버지 원숭이가 안 죽으려고 새끼 원숭이를 밑에 깔고 그 위에서 어떻게든지 살려고 애쓰며 새끼 원숭이가 먼저 죽어 가는데도 부모인 자기는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며 죽어갔더라고 한다.
이 이야기를 통해 남편이 하려는 말은 “모성애는 타고나는 것이고, 부성애는 형편없는 것이니 아이는 엄마인 네가 돌봐라” 였다.
이런 일도 있었다. 아이가 젖먹이 시절, 두세 시간마다 젖을 찾아 대는 아이 때문에 몸도 영혼도 너무 지쳐 미장원에 좀 다녀오겠다고 처음으로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나갔다.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신경이 곤두선 남편이 전화해대기 시작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아이가 빽빽 울어대고.
당장 들어오라고. 아이가 숨이 넘어가게 생겼다는 거다. 머리를 만 채로 집에 들어가니 집에는 남편이 아이를 달래려고 이것저것 시도한 흔적들이 널브러져 있고, 아이는 언제 울었냐는 듯 잠들어 있었다. 그다음부터 한동안 남편은 혼자 아이 돌보기를 극도로 거부했다. “나는 젖이 없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 사건 말고도 엄마인 나에게 육아를 떠넘기기 위한 ‘근거’는 무궁무진했다. 아이가 같은 책을 수십 번 읽어 달라고 하는 3~4세 즈음엔 “아빠는 글자를 몰라”라고 아이에게 말한다거나, 수련회에 갔던 나를 대신해 둘째에게 이유식을 먹이다가 작은 화상을 입힌 이후로 한동안 사고는 본인이 쳐놓고, ‘엄마 수련회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 모든 분란의 근간에 역설적으로 가정 안에서 ‘성 역할의 평등’을 기어코 실천하겠다는 나의 강력한 의지가 깔려있었다. 사사건건 남편에게 역할을 주고, 혹시 우리의 성 역할이 기울어져 있지 않은지 끊임없는 자기검열을 통해 늘 시비를 붙이는 내 덕에 그나마 이루어낸 지금의 평등, 평화라고나 할까.
그래도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가장 아찔했던 순간은 첫 아이를 낳고 난 직후였다. 친정, 시댁 어느 곳에도 산후조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내가 몸조리를 할 수 있는 곳은 산후조리원과 가정 산후도우미였는데, 당시만 해도 정부지원금이 전혀 없어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주변의 많은 사람이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었다. 아마도 주변 걱정 없이 산모 본인의 몸을 돌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걱정거리 중 하나’인 남편으로부터도 ‘분리’가 필요할 테고. 나도 처음엔 그런 생각이었다. 그런데 조금 생각을 해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이는 같이 낳았는데, 변한 환경을 왜 나 혼자 고스란히 맞이해야 하는가.”
여자는 아이를 낳으면 당장 생활이 바뀐다. 신체 변화를 경험해야 하고, 밤낮이 바뀐 아이 덕에 엄마의 밤낮도 덩달아 바뀌고, 사회생활의 단절을 경험해야 하고, ‘가슴’을 보유하고 있는 덕에 아이와 분리될 수도 없다. 미장원은커녕 머리 말릴 시간도 없어 부스스한 꼴로 종일 집에 있다 보면 우울증을 겪는 일도 다반사다.
반면 여자가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있는 동안 남자들은 어떤가. 퇴근하고 조리원에 들러 신생아실에 있는 아이 한 번 들여다보고, 부인 한 번 들여다보고 귀가. 아니야. 이건 아니지. 이러면 남편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없지 않은가. ‘그래, 어차피 집에 돌아가 겪을 일이면 남편도 처음부터 겪게 하는 거야.’
이런 결론에 다다르자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정 산후도우미를 신청했다. 우리 부부는 산후조리 기간 6:4 정도의 비율로 함께 힘들었다. 남편은 두 시간에 한 번씩 깨는 아이 덕에 아침마다 퀭한 눈으로 출근했고, 신생아 발톱을 잘라보겠다고 시도하다가 피를 보기도 했으며, 신생아 욕조가 있음에도 굳이 세면대에서 아이를 씻기다가 나에게 욕도 먹었지만, 그 덕에 아이 목욕과 기저귀 갈기는 나보다 훨씬 잘하는 아빠가 됐다.
물론 그 후로도 육아가 귀찮거나 꾀가 날 때면 그 ‘원숭이 부성애’ 얘기를 종종 꺼내 내 속을 뒤집어 놓았지만. “원숭이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그건 원숭이 얘기지, 사람이 왜 사람이냐. 본능보다 학습하는 내용이 더 크니 사람인 거지”라는 나의 면박으로 논쟁은 쉽게 끝나곤 한다. 맞다. 누구는 날 때부터 엄마였나. 이 사람아, 모성애와 부성애는 같이 배우고 자라는 거라고.
엄미야 _ 금속노조 경기지부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