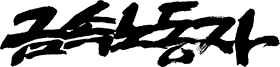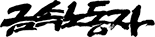해미(전종서)는 나레이터 모델 일을 하다가 우연히 유통회사 아르바이트를 하는 종수(유아인)를 만나 술을 마시러 간다. 이때 해미는 귤을 까서 먹는 팬터마임을 보여준다. 종수에게 말한다. “귤이 실제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 귤이 없다는 사실을 잊으면 되는 거야.”
해미는 종수와 두 번째 만남 때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다. 해미는 아프리카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행 기간 자신의 집에 있는 고양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한다. 해미의 고양이는 낯선 사람이 있으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해미가 고양이를 불러도 나오지 않자 종수는 고양이가 정말 있는 건지 묻는다. 그리곤 웃으며 고양이가 없다는 걸 잊으면 되는 거냐고 묻는다. 고양이를 돌봐주는 것도 팬터마임일 뿐일까? 해미가 여행 중인 동안 종수는 매일 같이 고양이 밥을 주러 가지만 한 번도 고양이를 보진 못한다.
청년의 욕망과 분노, 그 대상 없음에 대하여
이창동 감독의 8년 만의 신작 <버닝>은 그가 끊임없이 천착해온 영화 세계의 연장선에 있다. <버닝>은 청년 종수의 ‘욕망은 있지만, 욕망의 대상은 존재하지 않고, 분노는 있지만, 분노의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 말하고 있는 영화다.
대상이 부재한 세계로 초대하는 두 명의 인물이 해미와 벤(스티브 연)이다. 벤은 해미가 아프리카 여행에서 만나 함께 한국으로 돌아와 종수에게 소개한 인물이다. 해미는 종수의 욕망 대상이 되고, 벤은 종수의 분노 대상이 되는데, 욕망과 분노의 대상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에 대해선 글의 끝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먼저 이창동 감독의 전작들을 우회해 살펴보자.

이창동 감독의 영화에서 남성은 여성을 만나면서 낯설고 위험한 세계로 진입한다. 이창동의 영화들은 종종 팜프파탈로서 여성에 대한 매혹에 사로잡혀있다. 이 세계를 향한 진입은 매혹적이지만 위태롭고, 한 번 진입한 이후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 같다.
<초록물고기>에서 막동(한석규)은 미애(심혜진)를 만나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폭력과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 <박하사탕>에서 영호(설경구)는 순임(문소리)을 통해 20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며 절규하지만, 그 목소리는 바깥 세계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스스로 되돌아올 뿐이다.
<밀양>의 카센터 사장(송강호)은 어느 날 자신 앞에 나타난 낯선 여인(전도연)의 아픔을 돌보고 곁을 지키려 하지만, 이 여인에 대한 사랑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여인에게 밀양은 실재하는 장소가 아니라 상처와 자의식이 만들어낸 허구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실재? 거짓? 없다는 사실 잊기?
<버닝>은 더 나아간다. 해미는 종수에게 7살 때의 기억에 대해 말한다. 집 주변에 있던 우물에 빠져 간절히 누군가 발견해주길 기다렸는데 종수가 자신을 발견해 구출됐던 사건. 종수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 종수는 해미가 실종된 이후 동네 어른들에게 우물의 존재에 관해 묻는데 일부는 없었다고 하고 일부는 있었다고 한다. 해미의 어머니는 우물도 그런 사건도 없었다고 말한다.
벤은 종수와 함께 대마초를 피우는 범법 행위를 공유한 이후, 자신의 취미생활에 대해 말한다. 두 달에 한 번 정도 버려진 비닐하우스를 골라 불태우는 방화행위를 하고 있고, 이번엔 종수가 사는 파주의 비닐하우스를 골라 불태울 거라고 말한다. 종수가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 묻자 벤은 이유는 없고 비닐하우스가 자신이 불태워주길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해미 실종 이후 종수는 벤에게 파주의 비닐하우스를 불 질렀는지 묻는데, 벤은 그렇다고 한다. 하지만 종수는 날마다 파주의 모든 비닐하우스를 돌아다니며 불태워진 비닐하우스가 있는지 살폈는데 발견하지 못했다. 종수에게 실체는 의미가 없어지고 벤에 대한 분노만 커간다.
해미는 아프리카 토착문화인 ‘리틀 헝거’와 ‘그레이트 헝거’에 대해 말한다. ‘리틀 헝거’는 실체적인 배고픔, 물리적인 욕구를 말하며, ‘그레이트 헝거’는 삶의 존재의미에 대한 배고픔,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탐구의 욕망을 말한다. 해미는 ‘리틀 헝거’가 아닌 ‘그레이트 헝거’를 추구하고자 한다. 하지만 종수는 ‘그레이트 헝거’를 표현하는 춤을 추는 해미에게 왜 남자들 앞에서 옷을 벗냐며 창녀 같다고 말한다.
종수에게 ‘그레이트 헝거’는 벤의 세계, 나이 차이도 별로 나지 않는데, 포르쉐를 몰며 펜트하우스에 사는, 이해할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불가능성의 세계이다. 고양이는 정말 존재했을까? 해미가 말한 우물 사건은 실제 있었던 일일까? 벤의 방화에 관한 이야기는 진실일까? 해미는 왜 사라졌을까? 어딘가 살아 있을까 아니면 죽었을까? 아니 해미란 존재 자체가 허상인 건 아닐까?
청년들의 삶과 미래에 대한 질문
이창동 감독은 요즘 젊은이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한다. 요즘의 20대, 88만 원 세대라 불리기도 하고, 삼포 세대라 불리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노동자 또는 프레카리아트라는 신종 계급으로 불리는, 그런 청춘들.
종수는 해미의 실종 이후 걷잡을 수 없는 욕망과 분노에 사로잡혀 해미와 벤의 세계를 추적하지만, 아무것도 분명한 것은 없고 신기루와 같다. 욕망과 분노의 대상은 사라지고 오직 정체를 알 수 없는 욕망과 분노만 열병처럼 존재한다.
이창동 감독은 영화 <버닝>을 통해 동시대 청년들의 세계를 추적한다. 이창동은 대부분 작품에서 그랬던 것처럼 어떤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계속 질문에 질문을 이어간다. 영화 속 질문을 통해 청년의 미래에 관한 고민을 함께하는 일은, 한국에서 명맥을 이어가는 작가영화 한 편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일이 될 것이다.
강준상 _ 다큐멘터리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