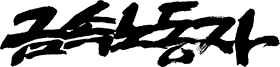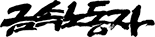배가 고픈 여우가 먹이를 찾아 숲 속을 뒤지다 사람이 사는 마을까지 내려왔다. 과수원엔 먹음직스러운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고 여우는 포도를 따 먹기 위해 힘껏 뛰었지만 도저히 닿지 않았다.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하고 뒤돌아 나오면서 여우는 중얼댔다. “저 포도는 분명 설익었을 거야. 난 신 건 좋아하지 않아. 맛이 없거든. 난 신 포도 따위는 먹지 않아.”
이솝우화의 ‘여우와 신 포도’ 이야기다. 강렬하게 원했지만 닿지 않아 포기하고도 저건 맛이 없을 거라고 합리화를 한 여우의 이야기가 떠오른 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청문회 첫 날(2015년 12월15일) 지상파 방송의 저녁뉴스 결과를 확인하면서다.
295인의 사망자와 9인의 실종자를 낳은, 살아남았기에 살아갈 삶의 무게를 견뎌야만 할 이들에게 생존자라는 이름을 부여한 끔찍한 참사가 발생한지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진상규명을 위해 열린 청문회지만 어느 지상파 방송도 잠시의 중계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세계의 선진 공영방송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수신료를 올려야만 한다고 말하고 또 말하는 한국의 대표 공영방송은 뉴스 말미 18초짜리 단신으로 중계조차 하지 않은 청문회는 전했을 뿐이다.
생각해보면 ‘여우와 신 포도’ 이야기를 떠올린 건 이날이 처음은 아니었다. 지난해 12월10일 조계사에서 은신하고 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찰 자진출두를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족히 50~60명은 돼 보이는 기자들에게 물었다. “제 말을 들으러 오셨습니까. 잡혀가는 모습을 찍으러 오셨습니까.” 이날 저녁뉴스에서 방송은 보도로 답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어떤 얘기를 하다가 한상균 위원장이 잡혀갔는지 관심 없다고, 중요한 건 그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기까지 장면을 포착하는 일이었다고 말이다.
그뿐일까. 지난해 11월14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중태에 빠진 이후에도 복면 쓴 시위대만 나쁘다고 말하는 이들의 앞에 마이크를 대주고, 노동자와 농민 등에게 전문 시위꾼이라는 이름을 붙여 그들은 시민이 아니라고 말하는 데 앞장선 언론의 모습에서 여지없이 탐스럽게 열린 포도와 이 포도를 포기하고 뒤돌아서며 맛이 없을 거라고 중얼대는 여우의 모습이 떠올랐다.

언론자유지수를 꾸준하고 하락시키고 있는 두 정권 동안 살아내기 전 언론의 모습이 최고였다고, 최선이었다고 말하진 않는다. 그러나 재난과도 같았던 참사가 발생하고 20개월 만에 겨우 열린 청문회를 고작 18초의 단신으로 소개하진 않았을 언론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고작 18초짜리 단신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을 때 독자이고 시청자인 시민들과 함께 분노하던 언론인들의 모습도 분명 있었다.
하지만 8년이 지나고 지금, 기대하고 분노하는 일은 시민들에게도, 언론인들에게도, 그리고 언론에게도 새삼스럽고 이상한 모습처럼 되고 있다. “뉴스가 추구해야 할 제1의 덕목은 진실의 추구”라는 저널리즘의 명제는 이미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달려 있는 포도가 됐는지 모르겠다.
포도에 닿기 위해 뛰어오르다 지쳐 저 포도는 익지 않았을 거라고, 맛이 없을 거라고, 조금만 더 견디면 잘 익은 포도송이가 앞에 펼쳐질지도 모르니 잠시 더 굶주림을 참자며 여우는 돌아섰다. 손에 닿지 않는 포도를 포기한 여우는 그저 ‘쿨’한 걸까. 포기하는 마음을 안 여우는 편했을까. 우리는 여우일까. 어려운 건 아닌듯한데 답을 내기 어려워 괜히 질문만 반복한다.
김세옥 / <PD저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