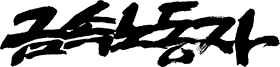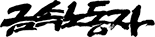명절이면 엄마와 반복하는 대화가 있다. “너한텐 멸치 주는 곳도 없냐?” “그런 거 받는 버릇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회사에서 받아오는 걸로 만족하세요.” 명절을 앞두고 출입처 관계자들과 반복하는 대화도 있다. “고작 멸치라니까요. 다른 기자들도 그냥 받았어요.” “회사에서 3만원 이상 접대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멸치는 3만원이 넘잖아요. 돌려보내기 귀찮으니 앞으로 보내지 마세요.”
이런 대화가 가능해진 건 팔년 전 <피디저널>에 들어온 이후부터다. 앞서 정치에 주력하던 매체의 기자로 일하던 시절, 일주일에 적어도 한 두 번은 취재원인 정치인들과 술을 마셨다. 대부분 고급이라고 말할 만한 가게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회사에서 정한 향응․접대의 한도 이상이었음은 분명했다. 하지만 같이 있던 선배들은 물론 회사로부터 반성이나 질책의 말을 들은 기억은 없다. 대표와 국, 부장으로부터 YS는 지갑 통째로 기자들에게 던져줬다는 등의 일화는 들었지만 말이다.

언론을 취재 대상으로 삼는 지금의 회사에 들어온 이후 기사를 쓰면서 이런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홀로 부끄러움에 몸서리를 치곤 한다. 당시 취재원에게 술을 얻어먹어도 기사는 별개라고 자신했다. 돌이켜보면 그런 구분은 쉽지 않았다. 얻어먹은 술의 값이 엄청나진 않은 덕분(?)에 “○○○ 의원 보도자료 냈던데, 술도 얻어먹었고 잘 좀 써줘”라는 선배의 말 정도만 들으면 됐던 게 다행이라고, 스스로에게 의미 없는 변명을 할 정도로 말이다.
부끄러운 기억을 호출한 건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이다. 그 중심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있다. 이 원내대표는 1월19일 기자들과 만나 “언론 자유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김영란법’ 재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가 우려하는 이 법안은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떠나 형사처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사자 가족이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상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을 경우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 원내대표는 “친척이 대접받는 일로 제재를 당하면 언론이 취재를 마음대로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런 말로 대중을 설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단 언론인이 1회 100만원 넘는 향응을 받는 상황은 그 자체로 상식적이지 않다. 값비싼 양주나 골프 접대를 받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00만원이 넘는 접대를 받는 언론인과 취재원의 관계가 정상이라고 과연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까. 이 원내대표의 우려와 달리 가족이 향응을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언론인이 바로 처벌받는 게 아니다. 가족이 향응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고 이를 신고할 경우 해당 언론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김영란법’ 처벌 규정이 언론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 원내대표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핵심은 이게 아니다. 중요한 건 언론인을 과연 공직자와 같은 범주에 넣어도 좋은가 이다. 공공성이 높은 만큼 언론과 언론인은 투명해야 한다. 언론 윤리를 지키지 못한 언론이 비판받는 이유다. 그렇다고 언론인을 공무원의 범주에 넣어도 좋은 걸까에 대한 의문이 사라지지 않는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지난해 국회에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8인 중 155인의 국회의원이 참여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방만한 공공기관의 운영을 바로잡기 위한 이 법안에 특히 더 많은 공공성을 요구받는 공영방송 KBS와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언론계는 즉각 반발했다. 아무리 공공성이 높다 하더라도 공영방송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자는 건 결국 ‘국영방송화’ 의도라는 문제제기다. 언론인을 공직자의 범주에 넣은 현재의 ‘김영란법’은 이런 우려를 비켜가도 좋은 걸까.
안타까운 건 이런 우려로 대중을 설득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다. 언론을 ‘기레기(기자+쓰레기)’로 호명하기 시작한 대중에게 현재 한국 언론은 권력지향과 부패지수가 높은, 청소해야 하는 집단에 가깝다. 아이러니하게도 ‘김영란법’으로 인한 언론 자유의 위축을 주장한 이는 현재의 언론장악 논란의 핵심에 있는 두 정권을 만들어 낸 여당의 원내대표다.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란을 언론은 어떻게 뛰어넘을까. 분명한 건 언론자유라는 당위의 ‘말’만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김세옥 / <PD저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