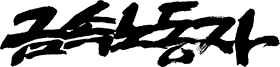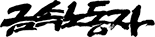“특별히 공연이 없는 날은 어머님들과 목요집회 사수하기로 했었는데, 콘서트, 지방공연 등 핑계가 왜 그리 많았는지……. 오랜만에 뵙습니다. 400회, 500회, 1,000회 할 때도 함께 하겠습니다. 목요집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날까지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철퍼덕 주저앉은 도로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에 점점 빨갛게 얼굴이 익어가던 1997년 어느 여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하 민가협) 목요집회에 참석한 꽃다지 가수의 공연발언이었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사무실에서 이 말을 한 가수에게 타박 아닌 타박을 했습니다.
“마음은 알겠다만 이게 덕담인지 악담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오래오래 목요집회를 해야 할 지경이라면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참혹하지 않겠니? 어머니들이 그때까지 고생해야 한다는 거야 뭐야?” 진담 반, 농담 반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는 몰랐습니다. 진짜로 500회, 800회, 900회 목요집회를 같이 하게 될 줄은…… 1,000번째 목요집회하는 날을 맞이하게 될 줄은…….
지난 10월 16일 오랜만에 민가협이 주최하는 목요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모처럼 꽃다지가 목요집회에서 노래한 그 날은 목요집회가 1,000회를 맞이하는 날이었습니다. 쓸쓸하던 평소의 목요집회와 달리 많은 분이 함께 했습니다. 기자들도 많이 왔습니다. “빨갱이들이 여기서 설치게 내버려둘 거야? 그만해!”라고 호통 치는 자칭 애국시민들도 여전히 함께 했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어슬렁거리던 경찰도 함께였으니 말입니다.

아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협의로 투옥됐던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께서 “목요집회가 통일과 평화, 진보를 추구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포근한 엄마의 품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들, 딸을 빼앗긴 그분들에게 이 사회가 엄마의 품이 되어 기대고 의지할 공동체가 되지 못할망정 자식을 감옥에 가둔 국가폭력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했고, 차가운 눈초리를 보내는 이들로부터 어떤 바람막이도 돼주지 못하는 현실에 착잡한 심경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외치며 시작한 목요집회는 인권의 영역으로 확장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느 양심수가 구속됐다는 소식을 접하면 가장 먼저 달려가 내 일처럼 앞장선 어머니들은 2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민가협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들이 모은 쌈짓돈과 뜻을 같이 하는 후원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은 양심수들의 옥바라지를 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이날 사회를 본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덕진 씨는 본인이 옥살이하며 받은 지원금을 갚아야 또 다른 양심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투쟁을 분노와 설움으로만 하지 않고 웃으며 풀어내려는 그의 말에 마음 한쪽 편이 찡해졌습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39명의 양심수가 갇혀 있다고 합니다. 민가협은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요집회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사람도 수명이 있고 단체도 수명이 있기 마련인데. 민가협은 민주주의가 성숙하면 없어져야 할 단체지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로 민가협은 상당히 오래 갈 것 같다”는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의 말에 토를 달 수 없는 현실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드높아진 가을 하늘로 날아오른 500여 개의 보라색 풍선은 파란 하늘과 대비돼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들께서 선물 받은 붉은 장미꽃도 아름다웠습니다. 20대 청년의 싱그러운 젊음도 빛났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존재는 검은 머리 장년이었던 어머니들이 백발이 된 지금도 여전히 양심수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여기며 석방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머리카락 성성한 어르신들과 청년들이 같은 자리에서 양심수 석방을 외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한 발짝 떨어져 지켜보는 이 날의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참가자들의 속내는 ‘이만큼이라도 지켜왔다’는 뿌듯함보다는 많이 씁쓸하고 아팠을 겁니다. 1993년 9월 첫 목요집회를 시작하면서 1,000번이나 목요집회를 해야 할 거라고 누가 짐작했겠습니까. 1,000회가 끝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 이어가야 하는 현실, 어쩌면 앞으로 1,000회를 더할지도 모르는 현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매번 불렀던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을 함께 부르며 1,000번째 목요집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노래는 생전에 시인이기보다는 ‘전사’이기를 자처했던 김남주 시인의 시에 가락을 붙인 노래입니다. 김남주 시인 역시 양심수였습니다. 그의 시 대부분은 감옥에서 썼다고 합니다. 흔한 연필 한 자루 없고 글을 쓸 수 있는 자유도 없어, 우유팩에 못으로 꾹꾹 눌러쓴 시를 몰래 밖으로 빼돌려 타자로 쳐 유인물로 만들어 바깥세상의 사람들에게 읽혔습니다. 엄혹하던 80년대에 그의 시를 절절한 가슴으로 읽으며 민주화 투쟁의 의지를 다졌겠지요. 가락을 붙인 서울대 민중가요 노래패 <메아리>의 일원이던 학생 변계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는 1988년 ‘전국대학생노래한마당’에 서울대 대표로 참가하여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을 불렀고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언젠가부터 이 노래는 많은 행사에서 마지막에 함께 어깨 걸고 부르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시구절처럼 둘이라도 좋지만 셋이라면 더욱 좋겠다는 바람이 간절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앞에 가며 너 뒤에 오란 말일랑 하지 말자 뒤에 남아 너 먼저 가란 말일랑 하지 말자’고 내 곁의 동지에게 당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다 못가면 잠시 쉬어가더라도 함께 가는 이 길에서 빗겨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오늘 소개하는 노래는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입니다.
민정연 / <꽃다지> 대표
|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김남주 시, 변계원 작곡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투쟁 속에 동지 모아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동지의 손 맞잡고 가로질러 들판 산이라면 어기어차 넘어주고 사나운 파도 바다라면 어기여차 건너주자 해 떨어져 어두운 길을 서로 일으켜주고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마침내 하나 됨을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