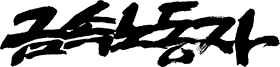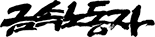취재를 하다 보면 유독 전화를 피하는 취재원들을 만나게 된다. 물론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들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전화를 해오거나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 전화를 걸면 받는다. 그런데 유독 연결이 닿지 않는 취재원들이 있다. 이들은 열 번 전화를 걸면 열 번 다 피하는데, 대부분 자신에 대해 혹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 호의적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기사를 써온 기자들이 그 대상이 된다. 이런 취재원들은 그간 기피해 온 기자들이 어쩌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오면 무심코 받았다가 서둘러 끊는다.
이럴 때 기자들은 기사 말미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다. “◯◯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결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어쩔 수 없는 마지막 방법일 뿐 최선은 아니기에, 가능한 설명이든 반론이든 상대의 입장을 기사 안에 반영하기 위해 기자는 자신을 피하는 취재원을 찾아간다. 신입 시절 “◯◯◯이 전화를 안 받는데요”라고 했다가 “그래서 기사 못쓰겠다는 거냐, 당장 찾아가!”라는 호통을 들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말이다.
취재의 이런 기본을 지키려 하던 기자가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해 6월 취재를 목적으로 MBC 보도국장실을 찾았다가 ‘퇴거불응’으로 기소된 <미디어오늘> 조수경 기자에게 법원이 지난 7월17일 벌금 100만원의 유죄 판결을 한 것이다. 어쩌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
시작은 언론노조 MBC본부(이하 MBC본부)에서 발간한 민주언론실천위원회 보고서였다. MBC본부는 보고서에서 김장겸 보도국장 취임 후 한 달 동안 MBC 보도를 분석한 결과 MBC 뉴스가 국정원 대선개입 등 민감한 뉴스를 회피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어떤 뉴스를 어떻게 내보낼 것인가는 보도책임자의 권한에 속하는 일인 만큼, MBC본부의 문제제기에 대한 보도책임자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조 기자는 판단했을 터다.
하지만 연락이 잘 닿지 않았고, 조 기자는 보도국장실로 올라갔다. 그리고 1분 13초 만에 쫓겨났다. 보도국장실을 찾은 조 기자가 소속과 신분을 밝히자 김 국장이 나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보도국장실을 방문한 이유를 밝히기도 전에 나가라는 소리를 들은 조 기자가 머뭇하는 사이 김 국장은 사람을 불러 그를 쫓아냈다. 또 조 기자를 업무방해와 무단침입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당초의 고소 사유와 달리 퇴거불응으로 조 기자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법원이 지난 7월17일 “(조 기자가) MBC에 출입기자로 등록하거나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보도국장실은 방문자를 허용하지 않는 곳”이라며 “김 국장과 취재 약속도 하지 않고, 편집회의 때문에 정신없는 상황에서 들어가 버티면서 나가기를 거부했다”고 밝히며 유죄 판결을 한 것이다.
취재를 위해 언론사 보도국장을 찾았다가 인사밖에 하지 못하고 1분 13초 만에 쫓겨난 기자와, 1분 13초를 머문 기자를 무단침입으로 고소한 MBC, 쫓겨나기까지 1분 13초를 머물렀다는 이유로 기자를 퇴거불응 사유로 기소한 검찰과 유죄 판결을 내린 법원 앞에서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제1항의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고 적고 있는 신문법 제3조는 앞으로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게다가 MBC는 법원 판결이 나온 당일 해당 소식을 자사 메인뉴스인 <뉴스데스크>에 “보도국 난입 <미디어오늘> 기자 유죄”라는 제목으로, CCTV 영상까지 공개하면서 전했다. 물론 어떤 취재원이든 취재를 거부할 순 있다. 반갑지 않은 기자가 허락을 받지 않고 찾아와 1분 13초를 머물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무단침입 등의 죄목을 부여하려 하고, 결국 퇴거불응을 앞세워 유죄 판결을 받아낸 주체가 언론사라는 사실은 씁쓸할 수밖에 없다.
언론 스스로 취재에 성역을 두겠다는 선언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미디어오늘> 기자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을 승전보처럼 전한 MBC가 이 점을 알길 바랄 뿐이다.
김세옥 / <PD저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