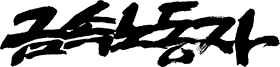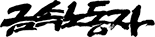지난 2월22일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이 17일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평소 관심도 없던 스피드스케이팅에 관심이 생기고 존재조차 몰랐던 ‘컬링’이라는 종목의 게임규칙까지 알게 되는 것을 보면 올림픽이라는 스포츠 이벤트의 힘은 대단하다.
이는 국가별 대항의 이미지가 더 강력한 월드컵도 마찬가지. 올림픽, 월드컵 등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세계 대중의 관심이 커지고 영향력이 커질수록 큰 힘을 갖는 곳은 월드컵과 올림픽을 주관하는 기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축구연맹(FIFA)이다. 스포츠마케팅의 세계에서 국가기관도 아니고 엄청난 재력을 보유한 기업도 아닌 이 두 기관은 어디 눈치 보지 않고 전 세계를 향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절대권력이 됐다.
이들의 권력을 보장해 주는 가장 큰 힘은 ‘공식후원사’들이 내는 엄청난 후원금이다. 현재 올림픽 공식 후원사는 삼성(무선통신), 코카콜라(음료), 비자(신용카드), P&G(생활용품), 파나소닉(TV․오디오), 오메가(시계), 맥도널드(패스트푸드), 아토스(정보통신), 다우(화학), GE(가전) 등 10개사다. 이 회사들이 IOC에 지급한 후원비용이 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한화 약 1조670억원)를 넘어서고 있다.
올림픽 후원사들이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IOC는 엄격한 마케팅 규제를 진행한다. IOC와 FIFA 모두 공식 후원사가 아니면 올림픽과 월드컵 관련 엠블럼․마스코트를 비롯해 ‘올림픽’, ‘올림픽 전문’, ‘월드컵’ 등의 명칭을 기업 광고에 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으로만 한정해 보면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어떤 기업도 올림픽 관련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방법은 있는 법. 소비자가 공식스폰서가 아닌 기업이 공식스폰서인 것처럼 느끼도록 하는 마케팅전략, 바로 매복(ambush)마케팅이다. 매복마케팅은 2002년 한일월드컵의 공식후원사였던 KT(당시 KTF)를 붉은 악마 응원단을 앞세운 SK텔레콤의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캠페인이 압도적인 차이로 눌러버린 사례로 유명해졌다. 당시 FIFA에 1천억원 이상을 후원금으로 냈던 KTF만 바보가 됐다.
이번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도 매복마케팅 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SBI저축은행의 광고를 보자.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금메달을 세 번 따면 SBI저축은행이 큰 사은품을 드립니다”라고 광고를 했다면 이는 IOC 규정 위반이다. ‘동계올림픽’, ‘국가대표팀’, ‘금메달’이라는 세 단어는 IOC(국내에서는 KOC)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SBI저축은행은 이렇게 표현했다. “러시아에서 애국가가 세 번 울리면” 이라고. 듣는 소비자입장에서는 똑같이 “금메달을 세 번 따면”으로 이해하지만 IOC의 규정을 교묘하게 피해갔다. 이것이 매복 마케팅이다.
비슷한 사례로 CJ제일제당의 광고를 보자. 광고 어디에도 러시아 소치라는 말이나 동계 올림픽의 오륜기 등은 없다. 소비자들은 눈 덮인 산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있는 그림을 보면서 ‘감동의 순간’이라는 카피를 보는 순간 올림픽을 떠올린다. 대한항공의 경우 아예 모델도 사진도 사용하지 않고 픽토그램(사물과 시설, 행동 등을 상징화해 사람들이 빠르고 쉽게 이해하도록 나타낸 표의 문자이자 시각 디자인을 말한다. 비상구 표시 같은 것)을 통해 올림픽 매복마케팅을 전개했다. IOC가 자신들의 거대한 스포츠 이벤트의 권리를 엄청난 방패로 보호하니 기업들이 매복마케팅 등 점점 영리해지는 창으로 그 틈을 파고들고 있다.
우리네 삶도 그렇고 노동운동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지만 어느 순간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 같고 도저히 뚫릴 것 같지 않은 벽 같은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다. 절망하지 말자. 반드시 방법은 다 있다. 10조원의 거대한 후원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IOC가 엄청난 규제와 보호 방패를 세워도 마케팅 전략가들은 구멍을 찾아내고 틈새를 찾아낸다. 뜻이 있다면 방법은 다 있다.
김범우 / 광고회사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