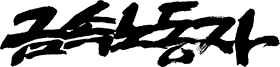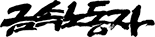광고는 기본적으로 <꿈>을 파는 산업이다.
<카스>는 맥주를 파는 것이 아니라 김수현이 되어 미녀들과 밤새워 춤출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꿈을 파는 것이고, <레미안>은 단순히 거주하는 집이 아니라 행복하고 프리미엄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꿈이다. 그런데 ‘꿈’이라고 해서 너무 허황되거나 공허하면 현실감이 없는 법. 현실보다 딱 반보 앞선 꿈을 파는 것이 광고를 만드는 기술이고 능력이다. 그리고 이런 대중보다 너무 앞서지도, 너무 뒤쳐지지도 않은 ‘딱 반보만 앞서는 능력’은 정치건 노동조합이건 대중을 상대하는 곳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일 듯하다.
현실과 꿈 사이에 광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광고의 모델은 대부분 국내산, 즉 우리나라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모델비로 몇 억원을 받는 김연아, 장동건, 이병헌 같은 빅모델이든 아니면 무명모델이든지 간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우리나라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광고를 보면서 쉽게 자신이 그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감정이입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그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S3와 갤럭시노트 <How to Live Smart>캠페인에 등장하는 주인공 모델들은 모두 외국인이다. 길을 가다가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결혼식장에서 친구들과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새로울 것 없는 일상적인 에피소드이지만 배경도 해외촬영을 기본으로 한 외국의 풍광이다. 미국에서 연비과장으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기업PR광고 <live Brilliant>캠페인 역시 모두 외국인 모델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환희의 순간을 표현하고 있는 live Brilliant 캠페인은 <감성 드라이브 릴레이>라는 부제를 달고 높은 영상미를 보여주고 있다.
금기시되던 외국인 모델을 광고에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변화를<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위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이제 더 이상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대한민국 기업이기 보다 해외 매출이 50%를 넘어가는 명실상부한 ‘글로벌기업’이 되었다는 자부심과 위상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보다 헐리우드블록버스터 영화를 먼저 보고 미드(미국 드라마)에 익숙한 우리나라 시청자에게 ‘외국인’들은 더 이상 낯설고 어색한 대상이 아니라 쉽게 감정이입이 되는 대상이라는 소위 ‘글로벌 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타당하다. 이제 눈이 파랗고 머리가 금발인 사람도 쉽게 나와 동일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두 맞는 말이다.

하지만 다시 한번 광고를 잘 살펴보라. 외국인들의 인종을 자세히 살펴보자.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광고 속에서 흑인 혹은 동남아시아인을 봤는가? 갤럭시 S3 캠페인 중 결혼식 편에서 보조모델 6명이 한꺼번에 슬쩍 나오는 남자 흑인을 제외하면 없다.
사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광고는 ‘글로벌 광고’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지독히 인종차별적인 ‘백인 우월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여 백인을 중심으로 하는 서양식 생활방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꿈꿀 수 있는 럭셔리한 스마트폰 광고에 흑인은 받아들일 수 없고, 에쿠스 같은 고급차 광고에 동남아시아인들은 등장할 수 없다.
물론 광고 속에 흑인 혹은 동남아시아 계통의 인종도 등장한다. 어디서? 바로 어린이 기아대책기구 등의 NGO단체의 광고속에서, 혹은 ‘태앙과 가장 가까이 살지만 늘 빛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두산중공업이 발전기술로 희망의 빛을 채우고 있습니다’, ‘물위에 살지만 늘 목마른 사람들을 위해 두산중공업이 지구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두산중공업>의 기업PR 속에 등장한다. <두산중공업>의 광고에는 서양사람이라고는 단 한 번도 등장한 적 없다. 아프리카 혹은 동남아시아의 오지 속에서 고생하는 사람들로 흑인과 동남아시아인들은 등장하고 있을 뿐.

이렇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보는 TV광고에서 금발머리의 서양인은 ‘우아하고 럭셔리한 삶을 사는 동경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고 흑인이나 동남아시아인은 ‘어렵고 곤란에 처한 동정의 대상’으로 구분되고 있다. 무의식적이지만 계속 누적되면서 강화되는 인종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결국 순혈주의 혹은 나치즘으로 대표되는 전체주의로 오도될 수 있고 서양에 대한 무차별적인 동경과 아시아, 아프리카에 대한 무조건적인 무시로 나타난다. 이미 구로나 안산지역의 조선족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이 공공연하게 등장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처럼 신자유주의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광풍이 몰아치기 전에 ‘신식민지론’이라는 이름으로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보면서 한국을 ‘종속국가’로 이해하곤 했다. 하지만 어느덧 중국과 일본은 무시하고, 아프리카는 동정의 대상으로, 같은 아시아인들을 업신여기면서 서양사람과 우리를 동일시화 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종속국가’를 벗어나 ‘지배국가’가 되었나 착각하게 된다. 1980년대라면 상상도 못했겠지만 쉽게 죽지 않는 제국주의의 싹은 2012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머리 속에서, 그것도 아무 비판 없이 반복적으로 보고 있는 TV광고 속에서 자라나고 있다.
김범우 / 어느 광고회사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