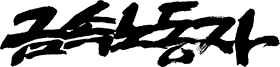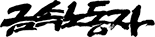그 투쟁의 이름은 ‘희망버스’였다. 조직 노동운동 판에선 메시지도 없고 요구도 없는 허용할 수 없는 이름이다. 그럼에도 희망버스는 처음의 3~4대를 훌쩍 넘어 17대를 부산으로 쏘았고 공장의 담장도 넘었다. ‘십여 대의 버스와 수백 명의 사람이 무엇이 대단한가?’ 할 분들이 있겠다. 그렇다. 희망버스가 다녀간 뒤에도 한진중공업의 희망은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러나 희망버스는 어쩌면 한 가닥 희망일지 모른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희망버스를 “30년 가까이 노동운동을 하면서도 겪어보지 못했던 아주 새롭고 신비로운 운동(한겨레 인터뷰)”라고 했다. 그렇듯 희망버스에는 조직의 권위가 작동하지 않았다. 지침도 없었고 그 지침에 적힌 무슨 무슨 결의대회도 아닌 그냥 소박한 이름의 버스였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한 개인들은 각자 자신들의 소박한 희망을 버스에 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희망을 실을 좌석이 있음에 기꺼웠을까? 아무튼 오는 7월 9일엔 185대를 목표로 2차 희망버스가 운행된다.
7월 9일 2차 희망버스
반면, 최근에 구성된 연대조직인 <민중의 힘>의 6월 11일 첫 집회는 조직을 탄생시킨 기나 긴 산고에 비한다면, 나아가 그 엄청난 집회명칭에 비한다면 맥 빠지는 대회였다. <민중의 힘>의 존재와 가치를 트집 잡을 생각은 없다.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를 꼬투리삼아 노동운동의 이름 짓기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다.

자본의 마케팅 전략 가운데 ‘네이밍(이름짓기)’이라는 것이 있다. 자본은 이를 브랜드 파워를 키우는 핵심전략으로 삼고 있다. 자본은 얄미울 정도로 치밀하다. 국내에는 네이밍 전문회사만 30~40개에 이른다고 하고, 최고경영자(CEO)들이 일일이 챙길 정도라고 한다. 그들은 시장성(대중성), 기억성, 차별성을 좋은 이름 짓기의 요소로 꼽는다. 이 기준에 비춰본다면 노동운동의 네이밍은 빵점이다.
63자나 되는 무지막지한 이름에 무슨 대중성과 기억성, 차별성이 있겠는가. 최근 색다른 이름으로 노동운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운동이 있다. ‘날라리 외부세력’, ‘레몬트리 공작단’, ‘희망버스’ 등등 이들 무정형적인 집단들이 자발적인 개인들을 흡수하고 있다. ‘시사콘서트’, ‘북콘서트’ 등 노동운동의 교육이나 학습활동과 유사한 또 다른 형태들도 있다.
예순 세자나 되는 집회명칭
지구 저편 유럽에서도 기억하기 쉽고 조직의 경계를 허문 투쟁 소식들이 언론을 통해 들려온다. 스페인에서는 인디그라노스(분노한 사람들)가 자발적으로 연대하여 시위이자 축제, 새로운 사회를 외치는 향연을 벌였는데, 순식간에 5만여 명이 모였다고 한다. 프랑스에서도 ‘분노의 시위’라고 명명된 3천여 명의 투쟁이 급속도로 전국 50여개 도시로 확산됐고, 그리스까지 영향을 미쳐 50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다.
2008년 촛불은 반짝이는 이름 짓기의 각축장이었고, ‘명박산성’은 권력의 불통과 억압을 조롱한 네이밍으로 뇌리에 박혀있다. 이에 따라 언론노조 등도 ‘개념탑재의 밤’이라는 대중적 집회명칭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대박 낸 투쟁브랜드는 없는 것 같다. 이에 반해 자본과 정권의 이름 짓기는 영악하다 못해 뻔뻔하며 왜곡된 프레임(사고틀)을 형성하기까지 한다. 신자유주의, 노사관계 선진화, 비정규직 보호법. 그리고 대량해고의 다른 이름 ‘구조조정’ 등. 그럴 듯하지만 그 내용은 비열한 이름들이다.
노동운동도 이제 기억하기도 어렵고 특정집단의 배타적 경계가 느껴지는 이름, 식상하기까지 한 온갖 결의대회 대신에 다른 이름 짓기를 시도하면 어떨까? 경박하고 자칫 투쟁의 의의를 희석시킬 위험이 있는, 얄팍한 기교에 불과할까? 그래도 63자에 달하는 집회명칭은 너무하지 않은가. 이런 요즘, 너무나 진부했던 한 싯구절이 새삼 진부하지 않게 들린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꽃 / 김춘수)
박성식 / 민주노총 부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