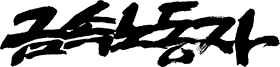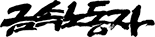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주민발의가 성사됐다. 안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보수 언론들은 아직 ‘불발의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서명 제출…발의여부 7월 확정…서명 명단 불과 3.6% 많아 실패 가능성 커 ’ 등의 제목으로 초치기 작전을 펼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6개월의 시간이 정말 숨가쁘게 지나갔다. 올 3월만 해도 5월까지 성공할 수 있을까 비관적 전망이 많았다. 민주노총, 전교조 등 조직이 기본적으로 하기만 해도 몇 만 명을 훌쩍 넘길 줄 알았던 서명이 여러 원인으로 주춤했기 때문이었다.

3월부터 폭풍 거리 서명이 시작되었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본부의 여러 활동가들, 특히 청소년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매주 청소년 활동가들이 쓰러지기도 했고, 링거를 맞기도 했지만 이 운동이 직면한 가장 큰 벽은 여전히 ‘어리다’는 것이었다. 직장이 있는 다른 노동운동단체 회원들은 거리 서명에 적극적이지 못했다. 오직 일이 없는 ‘탈학교’ 청소년 활동가와 인권활동가만이 매주 서명운동을 뛰었다. 서울 시민이 모이는 행사라면 어디든 뛰어갔지만 서명이 행사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헌신적이던 청소년 활동가들
사실 조례 제정 운동 본부의 이름으로 벽을 두드린 곳은 대부분 진보적인 단체인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인권을 보장한다는 아주 상식적인 취지가 안 맞는 행사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나는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이 자신이 당한 똥물 투척 사건을 보도해달라고 방송국에 찾아갔을 때 “배우지 못한 것들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며 여성노동자들을 개 쫓듯 내몬 사건이 떠올랐다. 이 정도는 아니었을 지라도 아마 그 당사자들은 서명지를 들고 온 청소년들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을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뭘?’
운동의 기본은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다. 돈이 많든 적든, 피부색이 하얗든, 까맣든, 어느 지역 출신 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떤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든. 그런데 ‘어리다’는 것은 진보적인 사람들 사이에도 그 벽을 넘지 못하는 걸까? 일상의 진보를 말하면서도 ‘애들은 가라’의 분위기는 여전한 것인가? 내가 만난 청소년 활동가들은 처음 보면 좀 낯설다. 학교에 대한 반항심으로 뭉친 이들은 염색을 하거나 머리스타일을 특이하게 하기도 하고, 운동을 한다는데 숫기가 없어서 말을 잘 안하기도 한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
이런 친구들이 노동자 대회 때 서명판을 들고 시청광장을 헤매었다.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앞뒤 가리지 않고 시간을 내고 몸을 댄다. 이들은 다른 어른 활동가들처럼 전략전술을 따지지 않고 일보전진을 위한 이보 후퇴따윈 하지 않는다. 자기가 몸담은 조직의 이익이 관철되지 않으면 대의를 포기하는 계산 따위도 하지 못한다. 사실 청소년 활동가의 상당수는 비인권적인 학교 시스템에 상처를 받고 이미 학교를 떠난 상태다. 그래서,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학생인권조례 운동은 이들이 편하게 살자는 운동이 아니다. 사실 이들은 “대한민국 학교 X까라 그래”라고 하면서 학교를 안주꺼리 삼아 비웃으면 된다. 그런데 이들은 누구보다도 조례 제정 운동에 헌신했다.

5월초 2만장 정도가 모자라 운동의 성패에 피를 말리고 있던 시절. 대표적인 먹튀 금융자본과 싸우고 있는 어느 금융노조에 서명 연대를 요청했다. 사실 그 쪽의 투쟁 사안이 워낙 시급하기에 연대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민망했지만, 학생인권조례 서명이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라도 가리지 않았던 활동가들은 ‘미안하지만’ 서명을 부탁했고, 노조도 ‘자신없지만 해보겠다’며 가져갔다. 서명 마감이 며칠 남지 않은 어느 비오는 날 발신자를 알 수 없는 우편서명이 도착할 때마다 희비가 교차하던 그 어느 날 비옷을 입고 빗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서명지 1000장이 든 박스를 든 사람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활동가들은 자신도 모르게 환호성을 지르며 그를 환대했다. 이제 성공할 수도 있겠다는 확신을 주는 분기점을 넘은 순간이었다.
빗물과 함께 도착한 1천장짜리 서명용지
며칠 후 직접 서명지를 전달했던 그 노조 활동가로부터 전화가 왔다. “제가 투쟁을 하며 그렇게 큰 환영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날짜가 남아있다면 좀 더 진행해도 될까요?” 막막한 투쟁에 지친 그 활동가에게 힘이 된 것이 무엇이었을까? 정치적 계산 따윈 할 줄 모르는 그 ‘어린’ 친구들의 진심어린 환대가 주는 따뜻함이 아니었을까?
학생인권조례 운동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말하기에는 아직 학교의 제도적 한계가 많고 시민 사회가 성숙하지 않다고 했다. 그리고 잘못 나섰다가는 학생들의 배후설에 시달릴 것이라며 운동에 발 담그기 싫은 마음도 내비쳤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학교 교육에 불만족스러워 하면서도 학교의 비인도적 모습에서 학교의 향수를 느끼듯 진보적인 사람들 역시 ‘학교는 아직.......’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그렇게 모두가 욕하면서 포기하는 학교를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서, ‘운동합네’하며 논평할 뿐 움직이지 않는 나이 많은 동지들 사이에서 기 죽지 않고 자신들의 에너지를 뿜어내는 그 ‘어림’에서 희망을 본다.
조영선 / 서울 경인고등학교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