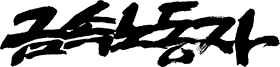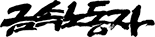2008년 유엔의 미래학자와 자연과학자들은 남성성을 결정하는 Y염색체가 점점 작아진다는 흥미로운 주장을 내놨다. 심지어 일부 제약회사에서는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떨어지는 감성적이며 정교하고 창의적인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약을 개발 중에 있다고도 한다. 그에 앞선 2007년 미국의 시사주간지 <US뉴스&월드리포트>는 가계의 소비활동에 있어서 가구선정의 94%, 휴가지 선택의 92%, 주택구입의 91%, 건강관련 소비의 80%, 자동차의 68%, 가전제품의 51%를 여성이 선택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남성은 기껏해야 골프채나 게임기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라고도 했다. 그리고 나의 축구팀 지인들은 주말에 밖에서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하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 이혼당하기 딱이라며 푸념하고, 인터넷 상에서 어떤 남성은 여성의 날은 있는데 왜 남성의 날은 없냐고 투덜대기도 한다.

과연 바야흐로 여성의 시대가 도래 하는가? 그러나 사실 이런 질문 자체가 남성 중심적 발상일 수 있다. 또한 여성의 날을 따로 정해야할 만큼 아직 세상은 여성들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력을 허락하지 않는다. 앞서 말한 연구나 조사결과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을까봐 불안한 나머지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남성들의 이야기다. 여전히 취약한 여성의 인권은 언론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고, 각 언론은 이에 대한 기사들을 보도했다. 그러나 역시 조중동류의 우익 보수언론들은 애써 이날을 무시하려는 태도가 역력했다. 조선일보의 김대중 주필은 여성문제를 기자들이 금기시하는 골치 아픈 주제라고 소개했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그 세계의 1인자답게 다소 건조하지만 여성의 날을 정면으로 다룬 칼럼을 실었다. 반면, 중앙은 아나운서 비하발언으로 한나라당에서까지 쫓겨난 강용석의원이 여성의 날 ‘성평등 걸림돌’ 상을 받았다는 소식만 손톱만한 크기로 실었고 동아는 시쳇말로 쌩깠다. 그러나 그나마 보도한 조선의 태도도 매우 정치적이었다.

여성의 날을 보도하며 여성계의 입장을 무시하는 것만큼 기만적인 언론이 있을까 싶다. 게다가 그 보도조차 정체불명의 화이트데이에 문제를 제기하고 상술에 휘둘리는 여성들을 향해 혀를 차는 내용이 핵심이다. 반면 건조한 보도태도로 정평이 난 매일경제는 보수언론임에도 103주년으로 표시하고 현재 여성노동자들의 겪고 있는 3중고(퇴출1순위, 비정규직, 저임금)에 대해 다뤘다. 100주년이냐 103주년이냐는 어찌보면 사소한 문제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그 사소한 것에조차 보수우익의 주도성을 지키는데 과민하고, 비주류세력에게는 그 어떤 것도 주도권을 내줄 수 없다며 당당하게 정치적 독점욕을 드러내고 있다. 왜 조선일보가 보수우익의 아성인지 새삼 실감나는 대목이다.
박성식 / 민주노총 부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