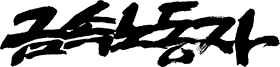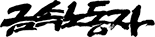지난 23일 농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현재 전국 6천 90개 농장 3백 40만 8천 여 두에서 구제역이 발생, 6천 72개 농장(340만6701마리)의 매물작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사실 나는 구제역 문제의 전문가가 아니다. 다만 본능적으로 이렇게 살다가 벌 받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뿐이다.
2월 졸업식 철을 맞아 ‘알몸 졸업식’을 막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졸업식장 주변에 경찰이 배치됐다. 7년 전 중학교 3학년 담임이었던 나는 ‘그 녀석들’ 중 하나인 한 아이가 밖에서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밀가루와 계란을 뒤집어쓰고 와서는 나와 작별의 포옹을 나눈 적 있다. 그런 퍼포먼스가 아마 나름 진화해 알몸에 이르렀는지 모르겠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어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누구나 어느 공간에서 존재감을 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학교라는 공간에 들어오면 존재 자체로서 존재감을 인정받을 수는 없게 된다. 뭔가 아이템이 있어야 그에 걸맞는 존재감을 인정받게 되는데 유능한 아이템은 역시 성적이다.

졸업식 때도 마찬가지다. 학교 내내 존재감 없던 자신은 마지막 순간에도 단상에 올라갈 수 없다. 자신이 누구인지 잘 찾을 수도 없는 교복을 입고 뒤에 어딘가에 어색하게 줄 서 있다가 가족들과 빨리 밥 먹으러 가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 한 번도 자기가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다녀본 적이 없는 학교.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러한데 그리 큰 아쉬움과 애틋함이 있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그들 나름의 마지막 퍼포먼스를 한다. 그것이 기성세대를 불편하게 하는 방식일수록 통쾌하다. ‘알몸졸업식’이라는 괴물은 그렇게 탄생한다.
나도 ‘알몸 졸업식’은 불편하다. 다만 아이들이 왜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지 살피지 않은 채 경찰을 투입하고 가족 아니면 졸업식에 오지 말고 학교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학교 모습에서 나는 ‘살처분 환영’을 본다.
모든 병의 징후는 소통의 몸짓이다. 아이들이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반항하고 사고치는 것은 “나 여기 살아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살펴주세요”라는 신호다. 그런데 우리 교육이 그런 신호를 다루는 방식은 어떠한가?
그래서 아이들은 더 큰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는 보호자나 학교를 불편하게 한다. 그래서 그 불편함을 우리는 ‘체벌’이라는 형태로 풀거나 ‘퇴학’이나 ‘전학’으로 배제한다. 마치 구제역이 발생하면 어떤 돼지가 걸렸는지 파악하여 살처분하는 것처럼 문제가 있는 아이를 골라내 억압하거나 배제해버린다. 이런 아이들은 그 상처가 점점 곪아터져서 괴물이 되어간다. 땅속에 묻혔던 가축들 피가 폐수가 되어 상수도를 오염시키듯 우리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범죄자가 된다.
교육의 시작은 “모든 사람은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하는데 있다. 존재자체로 사랑받았던 아이가 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 성적이 아닌 다른 아이템으로 존재감 외치는 아이들을 살처분하고 있지는 않은지 새학기 맞아 내가 고민하는 바다.
조영선 / 서울 경인고등학교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