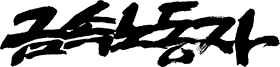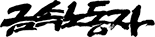프랑스가 아니라 한국이었다면, 그리고 책에도 인터넷 게시물처럼 댓글이 달릴 수 있다면 이런 기자체험류의 책에는 “지○한다. 넌 그거 마치고 다시 기자 하면 그만이잖아” 따위의 악플이 달렸을지 모른다. 하지만 책이 플로랑스 오브나의 『위스트르앙 부두』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그건 단지 오브나가 프랑스의 좌파신문 ‘해방일보’(리베라시옹, Libération)에서 오랫동안 기자생활을 해서가 아니다. 그 신문에서 르완다, 코소보,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분쟁지역 특파원을 도맡아 했기 때문도 아니다.
2004년 프랑스를 발칵 뒤집은 우트로 오판 사건을 파헤쳐 특종을 터뜨렸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이듬해 이라크 현지에서 저항세력에 피랍돼 유럽 도시 곳곳에 사진이 붙고 전세계적인 석방운동이 벌여졌을 정도로 유명한 대기자이기 때문도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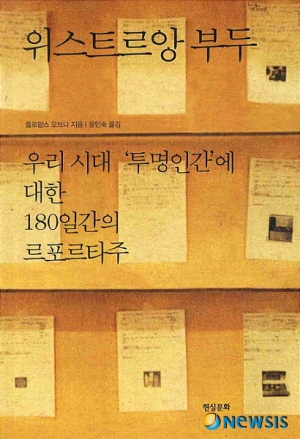
“넌 투명인간이 되는 거야”
평생을 청소부로 산 일흔두 살의 빅토리아는 오브나에게 “청소부가 되면, 넌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야”라고 말한다. 존재하되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들은 우리 주변에도 널려있다. 아침이면 지나치는 아파트의 경비원, 출근길 낙엽을 쓸어담는 청소부 아저씨, 남자화장실을 불쑥불쑥 드나들어도 항의를 받기는커녕 눈에 띄지도 않는 청소부 아주머니, 점심시간 손님들 사이를 바쁘게 오가며 ‘달인’의 솜씨로 빈그릇을 치우고 테이블을 닦는 식당 아주머니.
뿐만 아니다. 주차장 앞에서 현란한 손놀림을 하고 90도로 인사하는 젊은이들, 신기한 듯 쳐다보는 아이들 빼고는 눈 마주치는 이 없는 대형마트의 청년과 아줌마들,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그나마 지방 공단 중소업체에 파견직으로 취업해 최저임금 정도만 받는 블루칼라 노동자들.
위스트르랑으로 가기 전 오브나는 이런 얘기를 듣는다. 위스트르앙의 페리 선상에서 청소할 사람을 구하는 광고를 보면 절대 가지 말라는. 강제노동과 노예선의 고통을 합친 그 어떤 노동도 위스트르앙 페리보다 낫다는.
하지만 “초보자도 환영”한다거나 상시직, 정규직,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는 구인광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폴 앙플로와에서 오브나는 드디어 그 악명높은 구인광고를 본다. “위스트르앙 소재 청소회사에서 페리에서 일할 사람을 구함. 초보자 환영”
진공청소기의 일부가 된 노동자
차가 있다는 거짓말이 작용했는지 오브나는 덜컥 합격했다. 그리고는 1992년형 녹색 피아트를 급히 구했다. 그의 어떤 동료는 한 시간 일하기 위해 출근하는 시간만 세 시간이 걸린다니 그는 운이 좋은 편이다. 페리에서 내린 승객들에게 오브나와 같은 청소부는 그저 다리에 감아놓은 동아줄 더미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 기가 막힌 건 오브나가 어느 사무실을 혼자 청소하던 날의 일이다.
모두 퇴근하고 남녀 직원 둘만 남았는데 이들은 “자, 이제 우리 둘뿐이야”라며 사랑을 나눈다. 버젓이 세 명의 인간이 존재하는 사무실에 둘뿐이라니! 하지만 오브나가 진공청소기를 돌리고 쓰레기통을 부딪치며 일부러 인기척을 내도 그들에겐 그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

청소부 오브나가 한 달 동안 버는 돈은 페리에서 250유로, ‘땜빵’으로 들어간 곳에서 50유로, 임마퀼레 한 회사에서 400유로로 모두 합쳐 천 유로가 채 안 된다. 테스트 기간에는 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회사를 위해 무상의 노동을 하기도 한다.
위기 속으로, 그리고 우리의 위기를
오브나가 아무 연고도 없는 도시에서 익명으로 일을 구하기로 한 이유는 단순했다. “나는 기자다. 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현실을 도무지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다.”
스스로 위기 속으로 들어간 그의 용기, 투철한 기자정신에 경의를 표한다. 인도의 작가 아룬다티 로이의 이런 말도 떠오른다. “작가라면 늘 아픈 눈을 뜬 채로 있어야 한다. 날마다 창문 유리에 얼굴을 바짝 대고 있어야 하고, 날마다 추악한 모습들의 목격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날마다, 낡아빠진 뻔한 것들을 새롭게 이야기할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9월이여 오라』)
오브나가 위기 속으로 들어가 쓴 이 책을 읽으면 우리의 위기를 찬찬히 되짚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다. 우리가 지나치고 못 본 채하는 우리 주변의 ‘투명인간’들을 직시할 수 있게 된다. 훌륭한 르포문학을 접할 수 있는 건 덤이다.
윤재설 / 민주노총 선전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