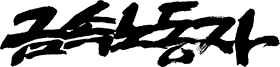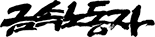국가체제는 기억력조차 당파적이고 정치적이다. 진보와 보수는 역사교과서를 놓고 지속적인 논쟁 중에 있으며, 정부 덕에 국민이 산다는 교훈을 가르치고픈 정부는 지난 28일 한국전쟁 당시 국군의 서울수복을 기념한다며 서울 한 복판에서 대대적인 전쟁행사를 열었다. 언론과 미디어의 기억력 역시 당파적이다. 한국전쟁은 <조중동>이 즐겨 기억하는 과거이며, 천안함 사태 당시 “전쟁을 결심하자”고 했던 중앙일보는 한국전쟁 60주년 기획을 줄기차게 써가고 있다. 그 목적은 전쟁 종식보다는 북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준 것이 정부고, 자신들 보수가 그 정부의 순혈 혈통임을 국민에게 각인시키기 위함이다.
국가 간 폭력의 위협을 강조하는 것은 보수언론이 애용하는 선전술이다. 반면 국가가 그 내부를 향해 저지른 폭력에 대한 보수언론의 기억력은 치매 수준이다.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은 구로에 최초의 수출전용공업단지를 조성했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200여 농민들에게 20여만 평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았다. 이후 농민들이 낸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하자 1970년 정부는 농민들을 마구 연행해 가혹행위를 하고 권리포기 각서를 받아냈으며, 거부하는 주민에겐 누명을 씌워 형사 처벌했다. 이른바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의혹 사건’이 36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다. 지난 9월20일 <경향> 등 일부 신문만이 관련 소식을 한 귀퉁이에 작게 실었다. 물론 <조중동>은 신문 한 귀퉁이조차 할애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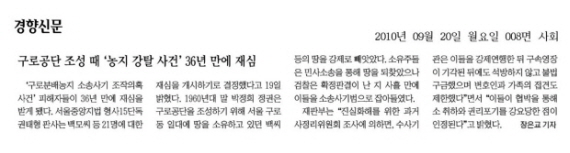
국가의 내부폭력에 보수언론 ‘모르쇠’
산업화 초기 한국 정부는 저곡가 저임금 정책을 통해 농민을 도시빈민으로 내몰고 혹독한 저임금으로 노동자들 착취했다. 18~19세기 영국정부도 농민을 토지에서 몰아낸 운동(엔클로저운동)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노동자가 일정 범위를 넘어 임금을 요구할 수 없게 한 법(에드워드3세의 <노동자법령>이 시초)까지 만들어가며 노동자 착취에 앞장섰다. 이것이 바로 ‘임금가이드라인’의 기원이다. 시간을 초월해 자본과 정부 관료의 말은 한결같다.
“노동자들이 높은 임금을 요구해 산업과 부를 위협한다” 19세기 영국 토리당(보수당)의 주장은 지금도 종종 우리 귀에 쟁쟁거린다. “정규직이 지나치게 경직됐고 임금이 높다”는 설교는 지긋지긋할 정도다. 여전한 저곡가 정책으로 농민은 지금도 몰락 중에 있다. 이미 상당수의 민중들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시장으로 내몰렸다. 최근 두 달 만에 42만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했듯 광범위한 산업예비군(실업)이 저임금 자본축적 구조를 떠받치고 있다.
그럼에도 21세기 자본축적의 위기를 겪는 국가와 자본은 계속 강탈할 땅을 찾고 있다. 바로 노동조합으로 단결한 정규직의 영토이다.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들의 유일한 영토를 완전히 빼앗기 위해 그들의 권리를 해체시키는 각종 제도개악을 추진했으며 준비하고 있다. 정규직을 몰아내는 정리해고 확대와 파견확대, 비정규직 기간제한 완화 등 이후 추진 가능성이 높은 이들 정책은 과거 저곡가에 기초한 저임금 정책을 잇는 현대판 노동 엔클로저운동이다. “모든 노동자를 노동조합의 울타리 밖으로 저임금 비정규직 시장으로 내몰아라!”
박성식 / 민주노총 부대변인